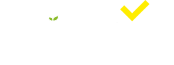[2018년 국정감사] 국민연금개혁 정책제안 ⑥
다층연금체계에서 노후소득보장 설계해야
기초연금 강화, 국민연금 내실화,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
중하위층, 국민연금+기초연금 / 중상위층, 국민연금+퇴직연금 중심
다층연금 총괄하는 ‘연금청’신설 필요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5회에 걸쳐 국민연금개혁 정책 제안을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구성된 다층연금체계 대안을 제시한다.
#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소득보장 설계 어려워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이다. 하지만 고소득자일수록 순혜택이 많은 역진성, 낮은 보험료율과 낮은 소득대체율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소득보장을 설계하기 어려운 것이 객관적 현실이다. 이에 기초연금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을 내실화하며, 퇴직연금을 공적연금으로 전환해, 중하위계층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중상위계층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노후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 기초연금 30만원: 2021년 A값 12%에 불과. 온전히 15%가 되려면 37.5만원이어야
기초연금은 노동시장의 격차가 큰 한국에서 무척 중요한 제도이다. 지난 9월부터 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되었고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추가 인상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 기초연금은 사실상 매년 물가와 함께 연동하는 체계여서 갈수록 소득대비 대체율이 낮아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2008년에 8.4만원으로(‘3년간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인 A값의 5%) 시작한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2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나, 매년 금액 조정 방식이 사실상 ‘물가 연동’으로 바뀌었다.
기초연금은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기준으로 환산하면, 2021년 가입자평균소득(월 250만원 전망)의 12%에 불과하다. 2014년 기초연금이 20만원으로 출발할 때는 대체율이 10%였고, 2017년에 물가를 반영해 20만 6050원으로 올랐으나 대체율은 가입자평균소득(218만원) 기준 대비 9.5%로 낮아졌다. 결국 실제 인상폭은 소득대체율 기준으로 2.5%p에 불과하다(2017년 9.5% -> 2021년 12%).
|
<표 1> 기초연금액과 소득대체율 추이 |
|||||
|
|
이명박정부 |
박근혜정부 |
문재인정부 |
||
|
|
2008 |
2014 |
2017 |
2018 |
2021 |
|
금액 |
8.4만원 |
20만원 |
20.6만원 |
25만원 |
30만원 |
|
가입자 평균소득 |
168만원 |
198만원 |
218만원 |
227만원 |
250만원(추정) |
|
소득대체율 |
5.0% |
10.1% |
9.5% |
11.0% |
12.0% |
기초연금액은 과거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가입자 평균소득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만약 2021년 기초연금을 소득 연동 15%로 상정하면 금액은 37.5만원이 될 것이다.
나아가 기초연금의 추가 인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초연금 인상은 상당한 재정지출이 수반된다.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후 소득연동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재정소요액은 2021년 GDP 0.9%에서 2041년 2.0%, 2061년 2.8%로 증가한다. 앞으로 노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12% 대체율에서도 재정지출이 2~3배로 늘어난다.
|
<표 2> 미래 기초연금 지출 전망 (소득 연동 기준) (단위: GDP %) |
||||
|
대체율 연도 |
현행 |
인상 |
||
|
12% |
15% |
20% |
25% |
|
|
2021 |
30만원 |
37.5원 |
50만원 |
62.5만원 |
|
0.9 |
1.2 |
1.6 |
2.0 |
|
|
2041 |
2.0 |
2.8 |
3.8 |
4.7 |
|
2061 |
2.8 |
4.1 |
5.4 |
6.8 |
|
2088 |
3.0 |
4.6 |
6.1 |
7.6 |
|
- 기초연금은 70% 대상. 12% 모형은 현행처럼 국민연금 연계 유지. 15% 모형부터는 국민연금 연계 폐지. 금액은 2021년 기준(A값 250만원). - 국민연금공단(2018), “기초연금 지출 전망” (국정감사 윤소하 의원 요구자료. 2018.9) |
||||
만약 2021년에 소득대체율 15%(37.5만원)로 인상한다면 재정소요액은 2021년 GDP 1.2%에서 2041년 2.8%, 2061년 4.1%로 늘어난다. 나아가 소득대체율 20%(2021년 기준 50만원)로 인상하면 재정소요액은 2021년 GDP 1.6%에서 2041년 3.8%, 2061년 5.4%로 높아진다. 결국 기초연금 인상은 적극적 증세를 통한 재정 확충을 요청한다. 기초연금 인상과 증세를 결합한 논의가 필요하다.
# 다층연금체계: 중하위층은 국민+기초, 중상위층은 국민+퇴직 중심
약 10년 전까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만 존재했으나 이제는 법정연금으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이 존재한다. 세 연금의 계층별 특성을 감안해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각 연금마다 개선해야 할 과제가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 연동으로 전환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감액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크레딧 제도를 강화하고, 도시지역 영세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 퇴직연금은 연금 형태 수령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공적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각 연금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노후보장의 시야를 세 연금을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로 넓혀야 한다. 다층연금체계는 계층별 맞춤형 노후소득보장을 도모한다. 국민연금은 노동시장 격차에 따른 연금액 격차, 퇴직연금은 노동시장 중심권에게만 제공되는 한계를 지니기에, 중하위계층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중요하다. 한편 중상위계층은 국민연금만으로 연금액이 부족하지만 소득대체율 21% 수준인 퇴직연금이 더해질 수 있다(퇴직연금은 소득상한 없음). 이에 중하위계층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중상위계층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노후를 준비할 것을 제안한다.
# 다층연금체계 총괄하는 ‘연금청’ 신설하자
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복지정책, 노동시장 조건을 감안하는 노동정책, 기금을 운용하는 금융정책 등 복합적 특성을 지닌다. 특히 다층연금체계로 노후를 설계하게 되면, 세 공적연금의 상호 관련성,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기금 운영 등에서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시민을 위한 연금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창구가 하나로 집약되는 게 바람직하다.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다층연금체계를 총괄하는 기구로 ‘연금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연금청은 다층연금제도를 종합 관리하면서 시민에게 노후소득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써 역할을 할 것이다. 연금청 신설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요구된다. <끝>
※ 문의 : 박선민 보좌관
2018년 10월 29일 (월)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