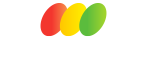[논평] 외국영리병원 외국인 의사비율 완화는 국내 영리병원 위한 수순 밟기
보건복지부가 어제(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현행 10%인 외국인 의사, 치과의사 고용 의무 비율을 아예 삭제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 영리병원이 개설하려는 진료 과목 가운데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등 16개 과목의 경우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 1명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진료를 위한 외국의료기관’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의료계, 시민 사회에서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외국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 안에 사는 외국인 진료를 위해 지난 2002년 처음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이 많이 살지도 않고 기대만큼 외국인 환자 유치가 쉽지 않자 2004년 슬그머니 국내 환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외국 자본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다보니 영리 병원에 좀처럼 투자하려고 들지 않았다. 급기야 2012년 외국인 의사만 있는 것으로 알았던 영리병원의 외국인 의사 비율을 10%로 대폭 낮춰 정해 버렸다.
그런데 복지부가 이번에 입법 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마저도 없애버리겠다는 의도다. 영리 병원을 향한 정부의 끝없는 갈증이 느껴진다. 사실상 내국인 대상 영리 병원을 세우려는 수순 밟기로 최소한의 빗장마저 풀어 버렸다.
복지부는 또 외국의료기관내 ‘진료와 관련된 의사결정기구’ 성원의 절반 이상을 외국 면허 의사로 해야 하는 규정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진료도 대부분 국내 의사가 하고 병원의 주된 의사 결정도 국내 의사가 하는데 무슨 외국의료기관이란 말인가.
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아플 때 꼭 비싼 ‘영리병원’을 고집해야 할 이유도 없다. 외국인에게도 비싼 진료비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사는 만큼 차별해서도 안 된다. 따로 영리 병원을 설립할 일이 아니다. 외국인진료를 위한 병원이라고 할지라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똑같이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본래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취지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시 생각하기 바란다.
2014년 11월 21일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